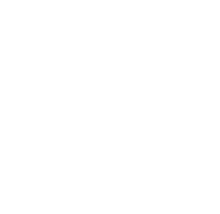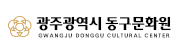전설/설화
뻐꾸기는 여름에 날아왔다가 겨울이 닥치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여름 철새인데, 그 명칭도 우는 소리를 본 떠서 포곡이(布穀), 포곡새(布穀鳥), 뻐꾹새, 법국새, 쑥꾹새, 꾸국새 등 매우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뻐꾹새 울음소리에 대한 슬픈 전설이 전해오는데, 아주 먼 옛날 남촌(南村)이라는 마을에 떡쇠라는 스물다섯 살의 가난한 총각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회갑을 넘기고 일흔에 가까웠으나 아직 기력이 충분하여 가끔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짝을 구해줘서 어떻게 여우살이(혼례식을 올리고 신접살림을 꾸리도록 하는 것)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열 입곱에서 여덟 살 늦어도 스물 무렵이면 다 장가를 가던 시절인데 나이가 스물다섯이나 되었으니 당시로써는 노총각 대열의 선두에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에 매파를 들여 그 해 늦은 봄 어렵사리 건넛마을에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스물한 살 먹은 덕순이라는 수더분한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수품이라고는 이불 한 채와 그릇 한 벌이 전부였으니 흔히 하던 말로 몸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새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신랑의 뜻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고 말없이 집안 살림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시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며느리를 들여왔다고 해서 떡쇠의 집안 형편이 별다르게 바뀐 것은 없었고 어느덧 몇 달이 흘러 어김없이 음력설이 닥쳐왔습니다. 쌀 한 톨이 아쉬운 처지였지만 그래도 선영의 조상께 떡국 한 그릇이라도 올려야 하였기에 절구통에 한 됫박의 쌀을 가루로 빻아 솥에 쪄서 가래떡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 이튿날이 되어 적당히 굳어진 다음 떡국 알맹이를 썰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정월 초하루 아침이 다가와 며느리는 귀한 달걀까지 풀어 넣고 정성껏 떡국을 끓인 후 얼른 식히기 위해 솥뚜껑을 열어놓았었습니다. 그리고는 툇마루로 가서 이것저것 묵은 나물 반찬을 한참이나 챙기고 나서 ‘지금쯤 적당히 식었겠지’하며 부엌으로 돌아와 보니 ‘아뿔싸! 이게 웬일이람’ 솥 안에 떡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 개가 제대로 누룽밥 한 번 먹지 못하고 맨날 배를 곯다시피 하고 아무 때고 동네골목에 버려진 뼈다귀 도막 하나 찾으려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돌아다니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항상 허기를 면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푸짐한 떡국을 본 누렁이는 ‘이거 왠 떡이냐’는 듯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뜨거운 것도 잊은 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이 핥아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방안에서 차례를 지낼 준비를 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떡국을 가지고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방문을 열고 나와 보니 부엌 가마솥 앞에 며느리가 우두커니 서 있고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려 쉽게 자기의 속내를 잘 내색하지 못하였던 며느리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개가 먹었다고 하면 가엾은 개가 실컷 두들겨 맞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드는 데다, 어쩌면 개가 먹었다고 말해도 매우 완고한 시어머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핏기 서린 눈으로 며느리에게 “이년! 니가 떡국 먹었지. 선영봉사할 떡국을 다 먹어버리고 어디 우리 가문을 망조들일 일 있느냐. 어서 바른대로 말해 봐라” 큰소리를 치며 다그쳤습니다.
머리채를 끌어 잡고 빨랫방망이로 며느리의 온몸을 사정없이 내려쳐 심한 매를 이기지 못한 며느리는 가엾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 엄한 누명을 쓰고 죽은 며느리는 뻐꾹새로 환생하여 이승에서 풀지 못한 가슴 깊이 맺힌 원한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달라는 뜻에서 “떡국 떡국 개개 개개개, 떡국 떡국 개개 개개개” 하며 절절하게 운다고 하였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꼭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이전글복룡동의 솔무대기 유래
- 다음글복받은 동생 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