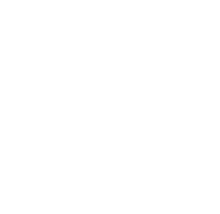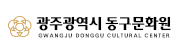전설/설화
옛날에는 마을어귀나 고개마루를 지나갈라고 하면 통행인 신변의 안위를 지켜주면서 재앙소멸과 행운의 도래를 위해서 돌무데기가 쌓여있는 서낭당 당산에 세 개의 돌맹이를 던지고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돌무데기로 된 서낭당이 아니고 조그맣게 집을 지어 신을 모시기도 하였지만 드물었고 대부분은 돌서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철수라는 총각이 서낭당곁에다 돌을 네모지게 쌓아 조그마한 돌집을 만들었습니다. 요즈음 같으면 흡사 개집 크기 정도나 된 듯 싶은데 돌집을 지어놓고는 겨울철에 비두로기(비둘기) 수십 마리를 몰고 와서 그 안에서 옇고(넣고) 곡식 쭉정이나 싸라기 등을 주면서 정성스레 키웠답니다. 비두로기들은 청년의 사육 덕분에 먹을 것 없는 추운 겨울을 별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고 더욱이 피둥피둥 살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엄동설한을 순조롭게 넘긴 비두로기들은 봄이 되자 정든 우리를 떠나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비두로기들은 못내 아쉬운 듯 쉽게 철수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고 몇 차례 뒤돌아보며 작별의 인사를 하는 듯 하였습니다. 철수도 마치 어린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이었지요. 이 후 철수는 읍내에 용무가 있어 일을 보고는 오후 늦게 석양이 질 무렵 오전에 건너갔던 마을 앞 냇가의 징검다리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어여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고운 용모여서 철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렇게 예쁜 여자를 한번 새겨(사귀어) 봤으면! 어떻게 말이라도 한번 붙여봤으면!’ 하면서 만감을 떠올리며 점차 접근을 해왔습니다. 가슴이 떨려 두 근 반 세 근 반하면서 철수가 그 여인 앞에 이르자 그 여인이 두 발을 폴짝 뛰어서 재주를 한번 넘더니 백년 묵은 백여시(흰여우)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여시는 “철수. 네 이놈!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적잖이 장장 10년을 기다려왔다. 그렇게도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야 나타나는구나. 어디 한번 나의 밥이 좀 되어보지 않으련” 외치면서 철수의 몸을 붙들어 잡고 다짜고짜 옷을 벗기려 옷깃을 당겼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 여우였든지 간에 이런 상태라면 철수는 잠시 후 영락없이 잡혀 먹힐 운명이었습니다. 철수는 죽을 힘을 다하여 여우에게 저항하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옷은 다 찢겨서 헤어지고 사람의 심장을 좋아하는 여우는 철수의 가슴팍을 할퀴고 물어뜯어 상처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이 경각(頃刻)에 달려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때 어디에선가 “뎅- 뎅- 뎅-. 뎅- 뎅- 뎅” 종소리가 힘차게 들려오는 것 아니겄습니까. 참말로 기적같은 소리와도 같았답니다. 여우가 가장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소리가 바로바로 종소리이기 때문이었지요.
좋은 먹이감을 먹으려하는 순간 놓치게 된 여우는 “아이, 재수탱이 없어. 다해놓은 밥에 코 빠뜨리는구먼. 오늘은 종소리 때문에 내가 순순히 물러간다만 철수 너 두고 보자. 너는 언젠가는 내 밥이 되고 말거야. 아이고 분하다 분해.” 하면서 백여시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떼면서 숲 속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철수는 몸을 추슬러서 징검다리를 건너 서낭당 앞에 다다랐습니다. ‘아! 이런!’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원 시상(세상)에 서낭당 옆의 종대(鐘樓)밑을 쳐다보니 땅 위에 수십 마리의 비두로기들이 대그빡(머리)이 터져서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두로기들이 지신들을 정성으로 거두어준 주인인 철수의 급박한 사정을 알아차리고 주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팽개치고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살신성인(殺身成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 이전글복룡동의 솔무대기 유래
- 다음글구렁이의 복수